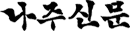“40년 넘게 하던 일이라….”
시골 5일 장을 돌아다니며 노점에서 옷을 팔고 있는 김남수(68·금계동)씨. 그는 이 일을 시작한지 벌써 44년이다. 예전에는 송정리, 남평 등 나주와 근교지역 5일장을 다니며 옷가게를 운영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 여러 장을 다니지 못하고 영산포풍물시장과 목사고을시장에서만 옷을 팔고 있다.
지난 5일 영산포풍물시장에서 김씨를 만났다. 김씨는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새벽 5시쯤 나와 노점에 자리를 편다.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이면 그늘막을 치고 판을 깔고 옷들을 진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 남짓 걸린다.
이렇게 시작한 장날의 하루는 저녁 8시쯤이 되어야 마무리가 된다. 그런데 장사는 잘 안된다. 손님이 뜸하다. 가뭄에 콩나듯 온다. 그래도 김씨는 활짝 웃는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5일 장을 찾는 이들이 적을 지라도 지금껏 장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찾아 주었기때문이라고.
“옷 팔아서 1남 2녀를 키웠어, 평생 이것만 해서, 몸이 움직일 수 있을때까지 계속 해야지. 지금은 겨우 생활은 유지하지.”

70년대 중반, 시골장에 ‘나일론 옷’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김씨는 ‘호황’을 맞았다. “질기고 색깔 좋은 나일론이 들어와서 잘 팔렸어. 아무리 장사가 안 돼도 5일에 한번은 물건을 띠었어.”
또 한번의 호황은 청바지가 맨 처음 나왔을 때였다. 교복자율화로 인해 옷 장사하기가 괜찮았다는 것이다. 5일장이 급속히 기운 때를 김씨는 90년대라고 말한다. “시골에 사람들이 많았어. 지금이야 사람이 없지만, 시골에 거주자들이 줄어들면서 장사도 안된다.” 사람이 없으면 되는 일도 없다는 것이다.
강산이 네 번 바뀌도록 장터를 지켰던 김씨. 장이 가장 볼 만한 때를 그는 “사람들이 걸어 다녔을 때”라고 설명했다. “친구도 만나고, 막걸리 한사발씩 나눠 먹고, 소리 지르며 싸움도 하고, 그래도 그때가 재미는 있었어. 지금은 자가용들이 있어 장 보고 횡하니 가 불면 끝이다.” 사람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던 그때, 정겨움이 넘치는 장터의 모습은 어느덧 사라지고 있지만 그래도 5일 장하면 왠지 따뜻함이 묻어 나온다.
작업복, 메리야스 등을 판매하고 있는 김씨는 요즘 들어 장사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옷 장사를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외국에서 가공해 들어 오는 제품이 많기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윤도 많이 줄었다고. 상권 축소를 아쉬워 했다. 예전처럼은 아니어도 재래시장 상권이 좀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그는 소박한 바람을 전한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 다양한 옷을 파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건강할때까지는 계속하고 싶다고 했다. “장사꾼이 뭐 있겠어요. 장사가 잘되면 행복한 거지. 건강하게 살면서 때되면 가는 것이 행복이지….”